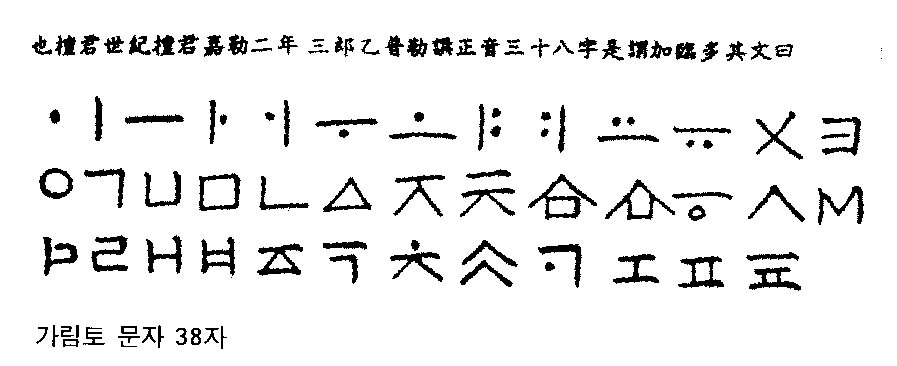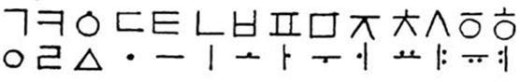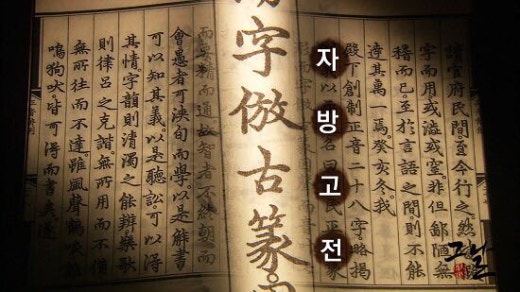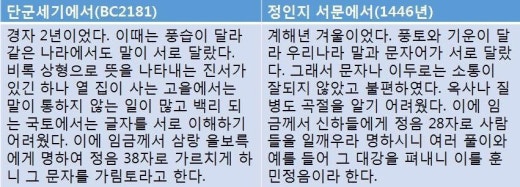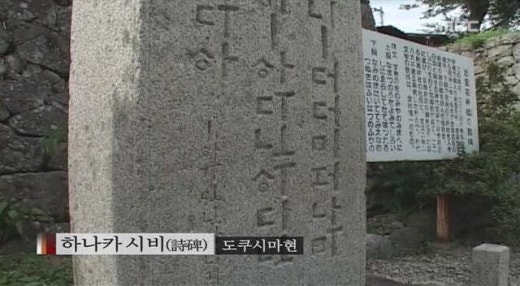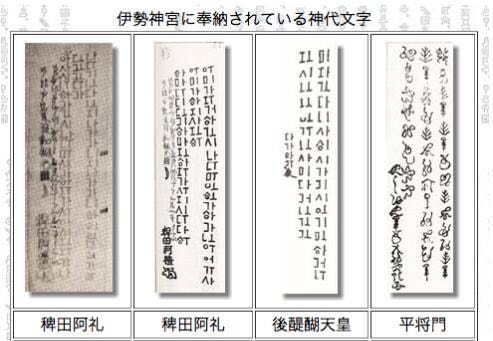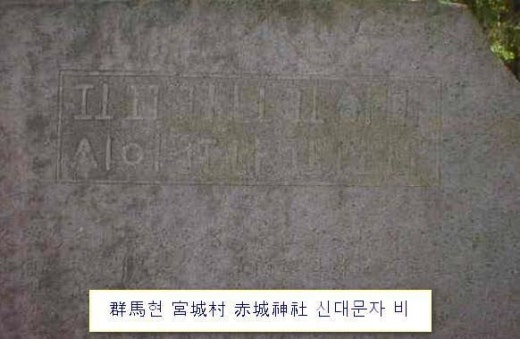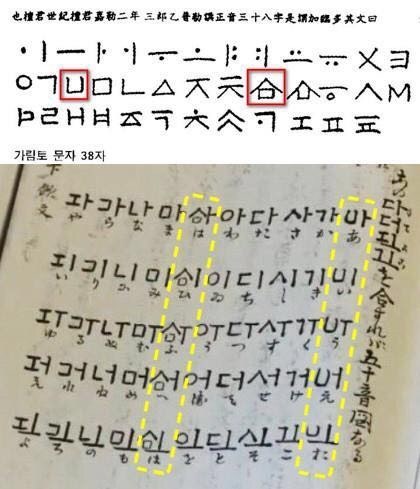이덕일의 새롭게 보는 역사 (서울신문 연재) 4.03까지
▶"우리 사회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역사관이 바로 서지 못한 탓" 2018.01.09.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09033623798
▶은나라 '왕실의 후예' 공자, 二代를 계승한 주나라를 인정하다 2018.01.16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16033631922
▶'기자, 조선에 망명'이 고려 때 '기자가 평양 왔다'로 둔갑하다 2018.01.23.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23033624147
▶기자 도읍지는 漢 낙랑군 조선현.. 평양은 후대 상상의 산물일 뿐 2018.01.30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30033631632
▶中사료들 "한사군, 요동에 있었다".. 韓은 일제 왜곡 학설 추종 2018.02.06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06033627619
▶동북공정으로 자신감 얻은 中..국가 차원 역사영토 확장 야심 2018.02.13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13033814017
▶'낙랑=평양'설..성호도 연암도 "北 평양 아닌 요동 평양" 갈파 2018.02.20.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20033809819
▶국고로 만든 지도에 '한사군은 北' '독도 삭제'.. 中·日 논리 추종 2018.02.27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227033636308
▶고려는 함경남도 남부까지?.. 총독부 학설로 끌어내린 2000리 2018.03.06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306033811409
▶압록강 서북쪽 '철령'은 요동.. 일제때 함경남도 안변이라 우겼다 2018.03.13.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313033815122
▶이성계 때 고려 강역도 계승..'철령~공험진'까지 엄연한 조선 땅 2018.03.20.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320033635275
▶淸, 국경 획정에 조선 대표 배제해 역관이 참석.. 백두산에 정계비 2018.03.27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327033815837
▶낙랑=요동설 vs 낙랑=평양설.. 北·中 국가대항전으로 번지다 2018.04.03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03033813091